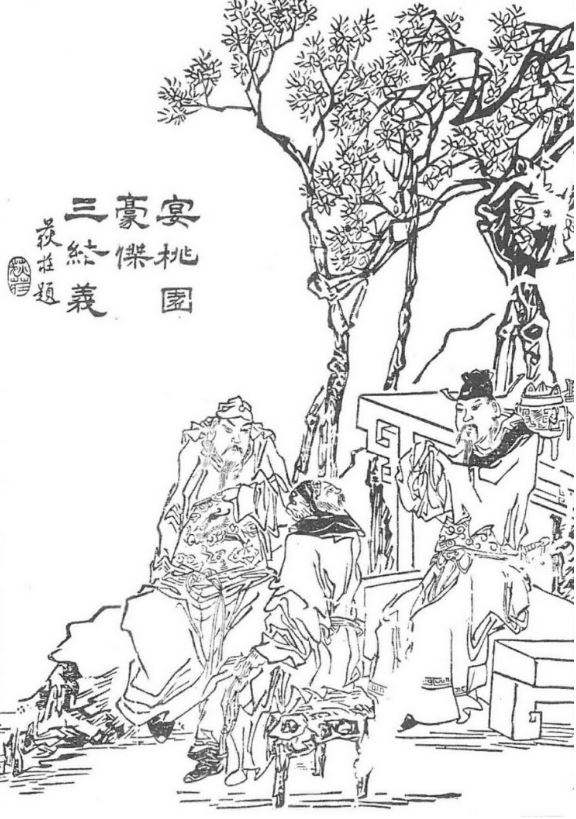진궁은 후한말의 동군(東郡) 사람이며, 자는 공태(公台)이다. 처음에는 조조를 따랐지만 그가 악하고 어질지 못한 것을 보고 떠났다. 나중에 여포를 따르며 종종 계략을 세웠지만, 그의 계략은 여포에게 채용되지 않았다. 결국 전투에서 패하여 조조에게 살해되었다. 진궁은 조조와 서로 알기 전에 중모현(中牟縣) 현령에 부임하였고, 도망치는 조조를 붙잡았지만 곧바로 몰래 석방하였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삼국지연의 제4회에 이 이야기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조조는 동탁 살해에 실패하고 낙양을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중모 현령인 진궁을 만난다. “왜 동탁을 배신하였는가?” 진궁이 추궁하자, 조조는 대답했다. “국가의 큰 적을 없애려 한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위조(僞詔)를 ..